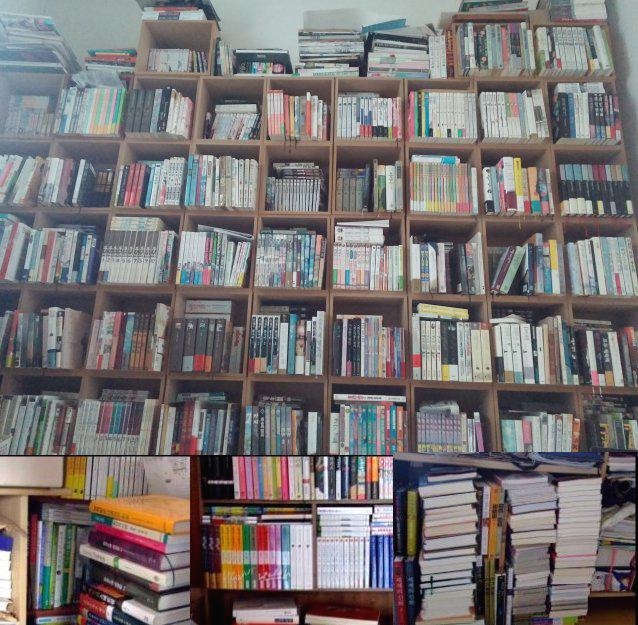티스토리 뷰
이것은 소설(novela)이 아니라 소셜(nivola)이다.
미겔 데 우나무노는 ‘안개’를 통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소설(novela)이라는 정의 대신 소셜(nivola)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통해 소설의 개념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형태로 구현하면서 자신의 작품의 문학적 영원성을 획득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같은 문학적 영원성의 획득은 동시에 작가 자신의 존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우나무노는 마치 ‘안개(niebla)’같은 소설을(작가는 작품 속에서 소설이 아니라 소셜이라고 강조한다.) 그려나간다. 내용적인 기이함이 아니라 형식적인 형태의 기이함을 통해 특이성을 강조하고 픽션의 세계를 부셔버리는 메타픽션의 형태를 자유롭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나든다. 작가의 존재, 작가가 그려나가는 작품의 존재, 그리고 작품 속에서 창조 된 인물들의 존재를 하나의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실제의 존재와 허구의 존재를 하나의 작품 안에서 녹여내었다.
작가가 오히려 자신이 낳은 허구적 산물의 장난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
소설의 주인공과 소설 밖의 작가를 연결시켜서 신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의 실존적인 문제들을 탐구해 나가며 우나무노의 실존적 세계관을 소설(소셜이라고 해야할지도)을 통해 구현한다.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를 작품 밖으로 끌어내어 존재의 의미를 탐구해 나가며 독자들에게 물음표를 제시하고 압박하기 시작한다. 실험적 형태의 작품을 통해 작가는 자신이 가진 철학적 사고를 문학적 형식을 통해 펼쳐놓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안개’라는 작품을 하나의 사고의 장으로 만들고 책 속에서 펼쳐지는 대화 속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난 장난치는 것을 좋아해.
언어가 가진 모호성은 “안개(niebla)”라는 제목의 이미지처럼 구체화 할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한 실체화에 관해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작품 속에서 독자들을 압박한다. 하지만 실제로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그다지 크게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언어가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웃음이란 비극’, ‘침울한 농담’, ‘서글픈 재치’ 등 모순 된 속성을 지닌 단어들을 조합하고 구체화하기 힘든 의미들을 모호한 이미지로 구현해 나간다. 실험적인 형태와 함께 이 같은 모호한 의미의 단어들이 만들어내는 안개의 이야기는 모호한 이미지를 중첩시켜 독특하고 색다른 느낌을 다가오는 것이다.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안개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한 여인을 만나면서 사랑에 눈을 뜨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다. 사랑에 눈을 뜨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큰 축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안개의 이야기는 흥미롭게 읽어나갈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형식에 있어 특이함은 내용적인 보편성에 흡수되어(그것도 사랑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소재를 통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안개의 페이지를 넘기면 누구나 쉽게 읽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의 힘이 있다. 물론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철학적, 사상적 배경의 무게감은 묵직하지만 무거움을 잠시 덜어주는 즐길 수 있는 이야기의 재미가 있는 작품이다. 그렇다면 철학자 우나무노가 아니라 소설가 우나무노의 작품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는 철학자이자 소설가 우나무노의 작품으로 수렴될 것이기 때문이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율리시스
- 센티멘탈 져니
- 타케우치 나오코
- 매직쾌두
- 타카하시 루미코
- 밀란 쿤데라
- 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 테즈카 오사무
- 은혼
- 아다치 미츠루
- 불새
- 이노우에 타케히코
- 마츠모토 타이요
- 센티멘탈 그래피티
- 아오야마 고쇼
- 타나카 요시키
- 야쿠시지 료코의 괴기사건부
- 원피스
- 카키노우치 나루미
- 클램프
- 제임스 조이스
- 토리야마 아키라
- 코난
- 괴도 키드
- 우라사와 나오키
- 버지니아 울프
- 카타야마 카즈요시
- 오다 에이이치로
- 명탐정 코난
- 리얼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