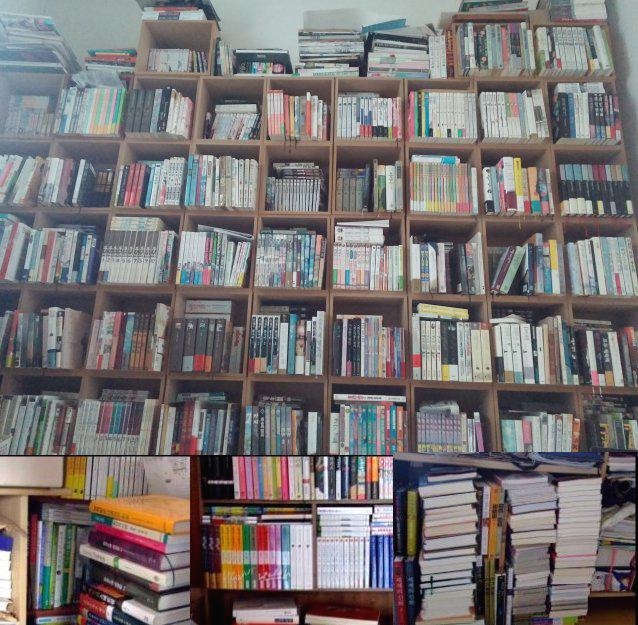티스토리 뷰
이문열은 고죽과 석담의 대립 관계 속에서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비록 그것이 추상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든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고죽의 회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작품은 시간을 거슬러 스승 석담과의 대립관계를 통해 작가의 예술론에 대한 팽팽한 싸움을 보여주었다. 고죽은 예술의 가치에 대해 완벽한 독립성을 가지고 예술 그 자체만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반면 스승인 석담은 예술을 통해서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술에 대한 입장차이는 결코 타협점을 보이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
‘금시조’는 예술의 궁극적 경지에서 도달하여 승화되는 순간 만날 수 있는 전설에만 존재하는 상상 속의 새다.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상징하는 새로 고죽이 평생 동안 만나지 못했기에 더욱 원할 수 밖에 없는 존재로 스승인 석담과의 오랜 갈등을 풀어 준 매개체 이기도 하다. 동시에 고죽이 스승 석담의 예술관에 대해 극복하기 위한 존재로 금시조를 통해 자신의 예술관을 증명하고 싶었던 징표이기도 하다. 석담은 죽는 순간 고죽의 예술관을 받아들이고 고죽은 석담이 죽은 이후 스승에 대한 예술관을 인정하게 된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두 사람의 예술관의 대립은 어느 순간 모호해지게 되고 작가 역시 명쾌한 답변을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작가는 마지막 고죽이 자신의 모든 작품을 불태우는 순간 금시조의 존재를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 어느 정도 예술에 대한 작가적 견해를 피력한다. 예술의 존재 가치와 진정한 의미에 대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고죽의 입장에서 조금씩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예술의 순수함에 대해, 예술 그 자체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순간을 승화시켜 낸다. 고죽의 작품을 통해 평생에 걸쳐 추구하였던 예술혼에 대한 형상이 금시조의 모습을 통해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PS 찬란하게 비상하는 금시조의 모습은 예술의 미(美)가 얼마나 숭고하고 순수함으로 가슴 깊이 감동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마치 금시조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이 작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작가는 금시조가 나타나는 단 한 줄을 통해 독자들을 전율시킨다. 이문열의 작품에 매번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금시조처럼 순간의 가장 황홀한 느낌을 절정으로 끌어올려 독자들에게 경험시켜 준다는 것이다. 금시조의 마지막 장면은 개인적으로 최고로 꼽는 명장면 중에 하나일 정도로 감동받은 순간이기도 하며 다른 이들에게 이문열의 작품의 진가를 알리고 싶을 때 먼저 떠올리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아다치 미츠루
- 이노우에 타케히코
- 밀란 쿤데라
- 불새
- 율리시스
- 매직쾌두
- 카키노우치 나루미
- 타나카 요시키
- 클램프
- 센티멘탈 져니
- 괴도 키드
- 마츠모토 타이요
- 리얼
- 원피스
- 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 테즈카 오사무
- 토리야마 아키라
- 아오야마 고쇼
- 제임스 조이스
- 카타야마 카즈요시
- 은혼
- 우라사와 나오키
- 야쿠시지 료코의 괴기사건부
- 타케우치 나오코
- 명탐정 코난
- 타카하시 루미코
- 코난
- 버지니아 울프
- 센티멘탈 그래피티
- 오다 에이이치로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