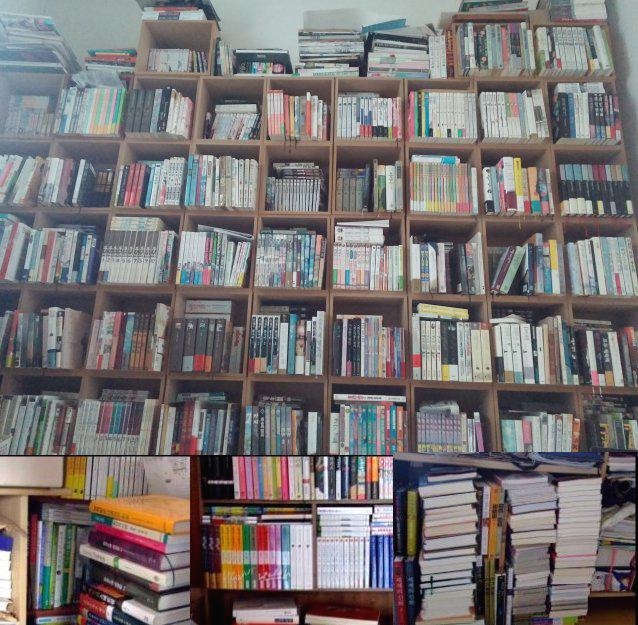티스토리 뷰

일상과 코믹함 사이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며 특유의 현실감을 보여주었던 유키 마사미의 기동경찰 패트레이버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에서는 철저하게 일상의 미묘한 코믹함이 배재되기 시작한다. 웃음이라는 요소보다는 보다 시리어스하게 접근하며 리얼리티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연출하게 되었고, 특히 곳곳에서 보여지는 사색적이고 정적으로 흐르는 연출은 패트레이버 시리즈의 세계관에서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본질에 가까운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개인적으로 패트레이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은 표면적으로는 잉그램VS그리폰의 대결구도-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갈등 요소-였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갈등 구조는 바로 바빌론 프로젝트와 그로 인해 문제시 되는 현대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이 아니였나 생각한다.)
20세기가 아닌 21세기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세번째 극장판 WXIII(폐기물 13호)는 이 같은 페트레이버 극장판의 연장선상에서 현대 사회의 모습들을 관통시켜 그 단면들을 투영하며 보다 진지하게 고찰하고 있다.
대의명문이 아니라 호기심과 욕망에서부터 시작 된 과학이라는 순수한 목적이 탄생시킨 폐기물 13호의 존재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적 결핍 상태,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일그러진 형태로 주입시켜 놓았다. 과학의 발달과 그에 따른 병폐가 일으킬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보여주는 인류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폐기물13호를 중심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현대사회의 모습, 도시의 모습을 담아내며 보는 이들을 조용히, 그리고 깊숙하게 작품 속으로 끌어들인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마음은 고독할 수 밖에 없는 현대인의 모습이 투영되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어머니이자 과학자의 모습,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섞여 드는 것 같지만 실제는 누구와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직장인,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며 유일한 취미 생활에 안도감을 느끼는 가장 등 폐기물 13호의 캐릭터는 화려함의 뒤안길에 쓸쓸하게 존재하고 있는 도시인들의 모습이다. 단절 될 수 밖에 없는 그들의 삶 속에서 몇 안 되는 접점이 존재하여 인연을 만들어가 가는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맺은 인연에 깊은 빠져들 수 밖에 없는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내었다.
이 같은 개인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로 확장시켜 보다 폭넓게 투영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오픈 되고 다양하게 펼쳐지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제한 적일 수 밖에 없는 사회다. 정보의 홍수 속에 진실은 묻혀버리고, 언론의 보도는 무서울 정도로 은폐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음모론마저도 쉽게 조작해 버릴 수 있는 정부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정보다는 보다 상위 계층과 큰 조직과 계층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시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전개해 나간다.
패트레이버 시리즈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특차 2과마저도 이 작품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되기 시작한다. 최소한의 접점만을 유지한 채 특차 2과의 존재의 가치는 패트레이버를 통한 사건의 해결을 위한 도구로 등장한다. 만화판 폐기물13호의 이야기가 작은 것에서 점점 확대되어 간다면 극장판에서는 극도로 제한 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그 틀을 유지시키며 담담하게 풀어나간다. 마치 늘 반복되는 사건이 하나 진행되고 해결 되는 것처럼 엄청난 사건마저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일상처럼 펼쳐진다. 사건은 커지고 상위 조직이 개입하기 시작하지만 마지막까지 하타와 미사키, 쿠스미로 대표되는 고독한 현대인의 모습이 유지되었고 만화와는 달리 일반 시민들의 인산인해는 보여주지 않는다.
‘패트레이버’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으면서도 특차 2과와 패트레이버의 존재를 철저하게 배재시킨 채 특차 2과가 아닌 3자의 시각에서 패트레이버의 주역들마저도 일상의 사건을 해결하는듯한 경찰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패트레이버는 특별한 존재가 아닌 사건의 해결을 위한 임무를 맡게 되면 출동하고 맡은 일에 충실할 뿐이다.
인류에 대한 경고로 비춰질 수 있는, 그리고 국가간의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문제, 사회와 정부의 병폐를 드러낼 수 밖에 없는 묵직함이 있는 작품이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 같은 이야기들은 손쉽게 잊혀지고 만다. 마지막 장면 역시 연정을 품은 여인의 무덤에 꽃을 바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었던 테마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고독한 현대인들의 마음 속 결핍을 일깨워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였을까?
- Total
- Today
- Yesterday
- 테즈카 오사무
- 버지니아 울프
- 카타야마 카즈요시
- 괴도 키드
- 원피스
- 율리시스
- 매직쾌두
- 토리야마 아키라
- 아다치 미츠루
- 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 카키노우치 나루미
- 아오야마 고쇼
- 클램프
- 리얼
- 불새
- 센티멘탈 그래피티
- 은혼
- 제임스 조이스
- 명탐정 코난
- 이노우에 타케히코
- 밀란 쿤데라
- 야쿠시지 료코의 괴기사건부
- 마츠모토 타이요
- 코난
- 우라사와 나오키
- 타나카 요시키
- 타케우치 나오코
- 오다 에이이치로
- 타카하시 루미코
- 센티멘탈 져니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